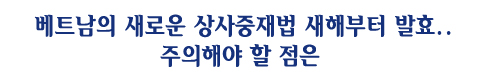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총 투자금액은 2009년 기준 USD20.4 billion으로 베트남 투자 국가 중 그 투자규모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투자건수 1위, 총투자금액 2위).


[출처: Business Advantage Vietnam 2010 ⓒCopyright Business Advantage International Pty Ltd]
투자금액과 투자건수가 많아진 만큼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법률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상사중재법(Law 54)'은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이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법률입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내에서의 국제중재행위에 있어서 기존의 상사중재법(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2003)과 2011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상사중재법(Law 54)간에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Commercial Arbitration, 2003)과 2011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상사중재법(Law 54)간에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중재법(Ordinance, 2003) |
상사중재법(Law 54) |
| 상사행위(commercial activities)의 정의: 상사행위의 범위가 최소 '상사법'에 따른 '수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와 '일방당사자가 상사행위에 관여된 분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제2조3항에 특정행위를 열거하는 식으로 정의함 |
상사행위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 |
| 중재인의 국적 |
| 베트남에 투자한(합작 또는 100%단독투자) 외국기업은 본 법령의 목적상 베트남기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없음.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3인의 중재인 중 2인은 베트남인으로 선정됨 |
법에 정한 중재인의 위촉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중재기관의 중재인으로 위촉될 수 있음 |
| 외국중재기관의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
| 설립 및 운영 불가 |
외국중재기관의 지점(branch)의 허가를 취득할 경우 본 법률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중재기관 운영이 가능 |
| 제3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장 선정: 당사자간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
| 법원에 선임 신청토록 당사자를 강제함 |
법원에 선임권이 넘어가기 전 당사자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지를 합의 결정할 수 있음 |
| 임시적 처분(Interim relief): 일례로, 분쟁의 대상 물건을 중재판정이 있기 전까지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 법원에 제소 후에만 신청 가능 |
일방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서 결정 |
| 준거법: 베트남 민법 제758조의 ‘foreign element’ 정의(“최소한 일방이 외국기관(기업),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를 준용 |
| 양당사자의 합의 및 베트남법률의 기본적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음 |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준거법을 정할 수 있음 |
| 중재언어: 베트남 민법 제758조의 ‘foreign element’ 정의(“최소한 일방이 외국기관(기업),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를 준용 |
| Foreign element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베트남어를 중재언어로 함 |
Foreign element가 있으나 중재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장 적절한 언어를 중재언어로 결정할 수 있음. 또한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이를 확대 적용함 |
베트남상사중재법(Law 54)은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와 중재선진국의 법제를 최대한 수용하려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여러 현실적 면에서 국제중재소재지로 관심을 끌기 위한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다만, 외국기업과 베트남기업간의 계약에 있어서 베트남기업의 계약위반 위험이 존재하고 그 베트남기업의 해외 자산이 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규모일 경우 베트남의 중재기관을 중재담당기관으로 계약에 미리 정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재판정까지의 기간이 소송기간에 비해 짧고(일반적 소송에 있어서 1심이 최소 2-3년 소요),
- 임시적 처분 결정이 가능하고,
- 중재판정에 대한 즉각적 집행이 가능.
베트남 법원 판례를 분석해 볼 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로 중재판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체결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베트남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베트남 중재법과 계약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주]
1. Ordinance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분야를 규율 하기 위해서 국회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을 의미하며 Law/Code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됨.
|